10나노급 5세대 전환되며 EUV 수요 증가
지난해에는 EUV 도입 목표 절반 이하로 축소
SK하이닉스가 올해 최소 6대 이상의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도입한다. 최선단 D램인 10나노급 5세대(D1b, 루시)들어 EUV 적용 레이어가 늘면서 관련 공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설비투자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EUV 도입 목표를 절반 이하로 크게 축소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올해 EUV 6~10대 도입
SK하이닉스는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최소 6대, 최대 10대의 EUV 장비를 도입하기로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EUV 5대를 도입키로 계획했다가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급전직하하며 실제로는 2대를 도입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전체 설비투자금액으로 10조원 안팎을 편성한 만큼 EUV 도입 대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간 설비투자 금액은 6조~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가 아직 D램 시황이 완연하게 회복하지는 못했음에도 EUV 도입을 확대하는 건 D램 세대 전환을 감안하면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10나노급 D램 4세대(D1a, 캐노퍼스)부터 D램 생산에 EUV를 적용했다. D1a는 현재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군이다. 1개 레이어에 EUV 기술이 사용된다.
차세대 제품인 D1b에는 최소 3개(최대 5개) 레이어 패터닝에 EUV 노광장비가 쓰인다. D1b는 SK하이닉스 웨이퍼 투입량의 1~2% 정도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의 전체 생산능력이 월 43만장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관련 공정 웨이퍼 투입량은 1만장 이내에 그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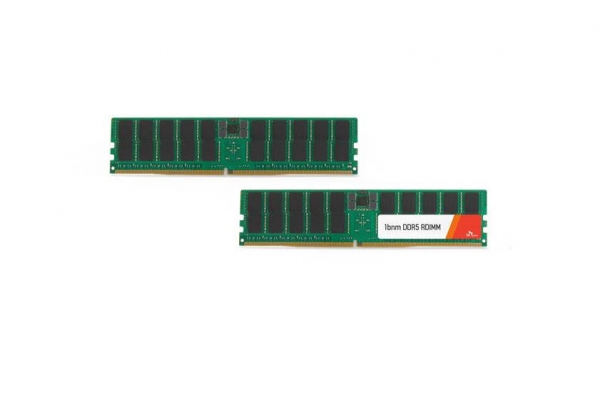
다만 SK하이닉스는 올해 연말까지 D1a⋅D1b 생산비중을 전체 웨이퍼 투입량의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D1b가 D1a 대비 EUV 적용 레이어 수가 많고, 생산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EUV 공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현재 SK하이닉스에 반입된 EUV는 총 5대로 추정된다”며 “올해 신규 반입되는 EUV만 지금까지 반입된 규모를 뛰어 넘는다”고 말했다.
중국 우시 공장, EUV 없이 D1a 생산 시도
한편 미국 행정부 제재 탓에 EUV 장비 반입이 금지된 중국 우시 공장은 EUV 없이 D1a를 생산하는 방안이 올해 추진된다(KIPOST 2023년 7월 21일자 <SK하이닉스, 중국서 D1a 생산에 EUV 대신 ArF-i 기술 적용 추진> 참조).
2~3년을 주기로 공정 전환이 이뤄지는 D램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의 공정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우시 공장은 기존 주력 제품인 10나노급 D램 2세대(D1y)⋅3세대(D1z)를 생산할 때는 EUV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우시 공장 역시 공정 업그레이드를 통해 4세대 제품인 D1a를 생산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당초 ▲EUV를 제외한 공정만 우시 공장에서 진행한 뒤, 웨이퍼를 국내로 옮겨와 EUV 공정을 마저 진행하는 방법 ▲EUV 없이 ArFi(불화아르곤 이머전) 기술만으로 D1a를 생산하는 방법을 모두 검토했다. 결론은 후자였다. SK하이닉스는 연내 우시 공장 일부를 D1a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시 공장은 C2와 C2F로 구성되는데 일단 C2 내 일부를 개조해 D1a 제품을 생산키로 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EUV 없이 D1a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방식이다. 다만 EUV를 썼을때보다 공정 스텝수가 늘어나는 탓에 수율이 저하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언젠가는 우시 공장에서도 D1a를 넘어 5세대 제품인 D1b, 6세대 제품인 D1c까지 생산해야 한다. 1개의 EUV 레이어를 ArFi 멀티패터닝으로 대체하는 것과 3개 이상의 레이어를 대체하는 건 난이도 격차가 크다.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EUV 레이어만 백업하는 방식을 도입해야만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웨이퍼를 옮겨가며 생산하는 방식도 생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라며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의 EUV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