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e모빌리티 포럼' 개최… 규제 영향 덜하고 실수요도 커
자율주행 기술은 진입장벽이 높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부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언제 완성될 지 모르는 기술에 수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대기업 뿐이다.
그렇다면 스타트업들은 어떤 시장을 겨냥해야할까.
지난 2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및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인공지능 혁신성장’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e모빌리티’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다 나와 스타트업을 세운 한지형 오토노머스AtoZ 대표는 “스타트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장 e모빌리티 시장이 스타트업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는 어느 상황에서든 스스로 주변을 인지, 판단하고 제어한다. 기술만 발전하면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도로 위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각종 규제를 해결해야하고,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꿔야한다.
e모빌리티는 스스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체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건 자율주행차와 비슷하지만 골프카처럼 크지 않아 규제에서 보다 자유롭다. 보통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계됐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달려 자율주행차보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 자율주행차가 시속 110km/h로 고속도르를 달리는 일반 차라면, e모빌리티는 택배·청소·트랙터 등 저속으로 일정한 루트를 오가는 특수 차인 셈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자율주행차는 규제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수요가 적고, 그나마 있는 수요도 전부 대기업이 쥐고 있다. 스타트업들에겐 장벽이 너무 높다. 반면 e모빌리티 시장은 대기업들이 진입할만큼 총가용시장(TAM)이 크지 않고 당장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기회다.
업계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업·물류업계 등에서 수요가 있다”며 “e모빌리티 기술 개발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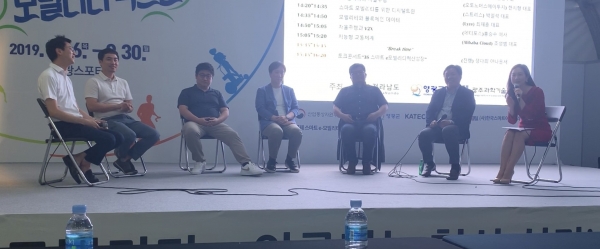
그렇다고 e모빌리티 기술 개발이 쉬운 건 아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려면 센서와 네트워크, 보안, 정밀지도 등의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이 기술들의 초점이 ‘자율주행차’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e모빌리티 기기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발맞춰 스타트업들은 ‘e모빌리티’를 위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밀지도 업체 스트리스(Strys, 대표 박일석)는 3분의1 가격으로 고정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스마트레이다시스템(대표 김용환)은 값비싼 라이다 대신 레이더만으로 물체의 거리·높이·깊이·속도를 알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했다.
서로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은 페이스북 페이지 ‘스마트카(Smart car)’를 통해 연을 맺었는데, 이 중 e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업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e모빌리티 포럼’을 만들었다.
공득조 GIST 인공지능연구소 박사는 “e모빌리티 포럼은 똑똑(Smart)하고, 안전(Safety)하고, 공유(Sharing)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며 “스타트업들을 적극 도와 e모빌리티 시장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